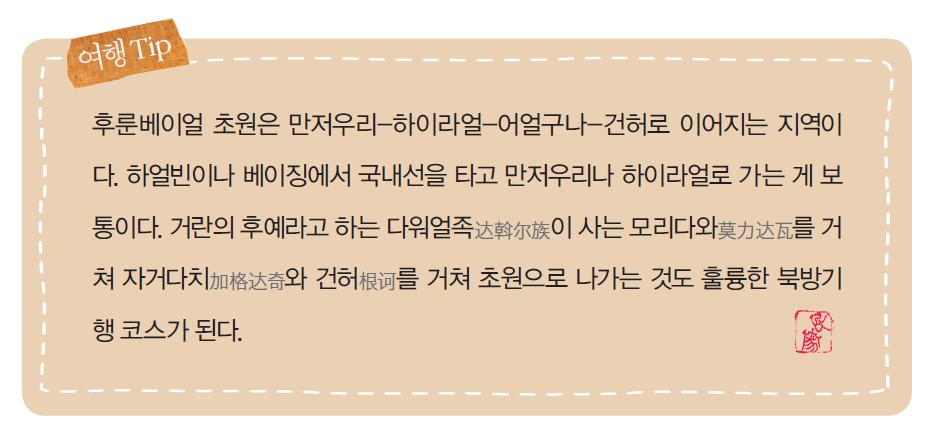북만주 어원커족·어룬춘족 사인주 – 고구려와 발해의 땅에서 수렵으로 살아온 사람들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를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역사라고 하지만, 발해 이후 지금까지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현재 그곳에 남아 있는 소수민족들이 고구려·발해와는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우리 의식 속의 연계성은 희박한 것 같다. 그러나 민족의 뜻에는 혈통과 문화 이외에 지역의 의미도 함께 들어 있는 법이다.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서 망외의 발견을 할 수도 있으니 그들의 살림집도 찾아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고구려와 발해의 땅은 현대에는 만주 또는 동북이라고 한다. 이 땅에 지금은 누가 살고 있을까. 2013년이란 시간적인 단면에서 인구만 따지자면 한족이 가장 많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허베이와 산둥의 한족 2,000여만 명을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1000년의 역사를 묶어보면 금나라의 여진족과 그 후예들인 청나라의 만주족이 주인공이었다. 19세기 초·중반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상당수의 우리 민족이 이주했고, 아직도 많은 동포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의 연계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동포를 찾아가는 길에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또 다른 소수민족이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방 삼림의 수렵민으로 살았고 곰의 신화가 풍부한 어원커鄂温克족과 어룬춘鄂伦春족이다. 어원커는 ‘대삼림 속에 사는 사람’ 혹은 ‘산의 남쪽 비탈에 사는 사람’, 어룬춘은 ‘고갯마루에 사는 사람’ 혹은 ‘순록을 이용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번에는 이들의 살림집을 찾아 북방 소수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음미해보자.
어원커족은 네이멍구자치구 후룬베이얼시呼伦贝尔市의 남부에 자치기自治旗가 있고, 이곳에서 200km 북부의 건허根河에는 별도의 정착촌이 있다. 어룬춘족은 건허의 동쪽에 자치기가 있다. 자치기의 기旗는 네이멍구자치구에서만 사용하는 현급 행정구역이다. 교통으로는 헤이룽장성 수도인 하얼빈을 통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얼빈에서 북서쪽으로 350∼700km나 되는 먼 곳이다.

민족 자치기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자치민족 인구가 많지만, 중국 어느 지역이든 자치지역에서조차 대부분 한족이 더 많다. 어원커족은 어원커족 자치기 인구의 7%에 불과하고, 어룬춘족은 자치기 인구 28만 가운데 2,000여 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치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자치보다는 소수민족 배려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어원커족은 바이칼호 동쪽으로 러시아와 몽골공화국과 중국에 걸치는 넓은 지역에 작은 마을로 분산되어 있다. 인구가 적은 데다 척박한 환경 탓에 유목이나 어로 수렵으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어원커족은 중국에서의 민족명이고, 러시아에서는 에벤키Evenki족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퉁구스’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유라시아의 민족과 언어를 분류할 때 알타이산맥의 서쪽, 즉 신장성과 그 서쪽을 투르크계, 알타이산맥과 다싱안링산맥 사이의 몽골고원은 몽골계, 다싱안링산맥의 동쪽은 만주-퉁구스계로 구분한다. 이 퉁구스가 바로 어원커족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어는 알타이어 계통의 만주-퉁구스어에 속한다, 아니다”라는 학술논의로 인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명칭이다. 우리말이,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름조차 낯선 퉁구스어 계통에 속한다는 가설이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가설이 제기될 만큼 퉁구스어와 우리말은 언어구조가 유사하고 계통상의 인접성이 있다. 17세기부터 러시아가 동진해 오면서 이 지역의 민족과 언어에 대한 학술연구가 이뤄진 탓에 러시아와 서방 학자들이 먼저 마주친 퉁구스를 학술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어원커족은 중국에 3만여 명, 러시아에 4만여 명, 몽골공화국에 소수가 살고 있다. 후룬베이얼시 남부 지역의 어원커족 자치기에서는 농업과 목축을 주로 하지만, 건허의 어원커족(아오루구야敖鲁古雅 어원커족이라 한다)과 러시아의 에벤키족은 수렵과 순록 사육을 생업으로 살아왔다.
건허에는 중국 정부가 제공한 어원커족 정착촌이 있어 북방삼림의 순록과 수렵문화를 엿볼 수 있다. 건허는 어룬춘족 자치기와 지리적으로도 접해 있고, 자연환경과 수렵생활은 물론 신화와 언어까지도 유사한 것이 많아 어원커족과 어룬춘족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학자도 많다. 이들의 살림집도 그렇다.
이들은 원뿔형의 이동식 천막집에서 살았다. 사인주斜仁柱, 선인주仙人柱 또는 촬라자撮羅子라고 한다. 사인과 선인은 나무줄기란 뜻의 어원커어를 중국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촬라’는 뾰족하다, ‘주’와 ‘자’는 집이라는 뜻이다.
위의 두 사진은 어원커 정착촌에 지어준 현대식 주택과 마당 앞에 임의로 세운 사인주다. 아래 왼쪽 사진은 정착촌 주택이고, 오른쪽 사진은 정착촌의 박물관이다. 집의 구조는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비슷하고 간단하다. 가늘고 긴 나무를 여덟 개에서 이삼십 개를 우산살처럼 세워 하단은 땅에 묻는다. 상단은 정수리 부분에 지름 10cm 정도 구멍을 남기고 끈으로 묶는다. 이 구멍은 채광창 겸 환기구다. 사인주는 겨울에는 모피로, 여름에는 자작나무 껍질로 덮는다. 출입문은 동남향이거나 서남향이다.
실내에는 중앙에 불을 피워 난방과 취사를 겸하고, 안쪽 삼면으로는 침상을 놓는다. 정면의 위쪽을 마루瑪路라고 하는데 그 아래의 자리는 존귀한 곳으로 연장자나 주인 남자가 자는 곳이다. 마루에 사람과 가축을 보호하는 신상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 이곳에는 여자가 앉거나 눕지 못한다. 마루의 좌우측은 아오루奧路라고 하는데 좌측이 우측보다 위계가 높다. 미혼 여자 침상은 문쪽에 놓는다.
사인주는 전형적인 이동형 주택이다. 겨울에는 3∼4일마다 한 번씩 이동하고, 여름에도 한 곳에서 보름 이상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동성이 중요하다. 사인주는 남녀가 역할을 나눠 짓는다. 남자는 나무를 구해 오는데 주로 자작나무와 버드나무다. 여자는 자작나무 껍질을 삶거나 모피를 손질해서 사인주를 덮고 바느질로 봉합한다. 두세 사람이 한 시간이면 능히 지을 수 있다.

하나의 사인주는 보통 한 가정이다. 사인주 하나에 3세대 일곱 명을 넘지않는다. 그 이상이 되면 사인주를 하나 더 짓는다. 이들은 작은 무리를 이뤄 이동생활을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분리한다. 이렇게 집단을 이뤄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작은 무리를 우리렁烏力楞이라고 한다. 하나의 우리렁은 적게는 십수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달한다. 사인주 몇 개가 들어서는 규모다. 사인주를 추가로 지을 때는 기존 사인주의 좌우로만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렁의 전체적인 모습은 좌우로 일직선이거나 호형이다.
이들 민족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록을 키우고 사냥을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다. 순록은 젖과 고기는 식량으로, 뿔과 심장은 약으로, 털은 옷으로 내주었다. 우리렁이 이동할 때에는 짐을 실었고, 혼자 있으면 친구가 되어 주었다. 순록은 생존의 모든 것이라 이들의 문화는 곧 순록문화라고 할 수 있다.
순록은 기이한 구석이 있다. 순록을 사불상四不像이라고도 하는데, 머리는 말과 비슷하나 말이 아니고, 뿔은 사슴과 비슷하지만 사슴이 아니고, 몸은 나귀가 아니고, 발굽도 소는 아니라는 말이다. 속뜻은 말처럼 위풍당당하고, 사슴처럼 아름답고, 나귀처럼 건강하고, 소처럼 강인하다는 것이다.
아오루구야 어원커족이나 어룬춘족의 삶과 문화를 들여다보면 언제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旣視感이 피어오르기도 한다. 어룬춘족 자치기에는 아리하阿里河라는 작은 강이 흐른다. 한강의 옛 이름이자 서울시가 생산하는 식수의 이름 아리수와 같다. 압록강의 압록 역시 중국 발음으로 ‘야뤼’인 것과도 상통하는 발음이다. 씨족이나 부족, 민족이 이동하면 강이나 산의 이름도 함께 가져간다는 어느 사학자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들과 우리의 조상은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와 서방 학자들이 제기했던 퉁구스어와 우리말의 인접성은 한국학자들에 의해서도 구체적인 연구성과들이 쌓이고 있다. 강덕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교수는 에벤키어와 우리말의 기원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연구해 발표했다. 우실하 항공대학 교수는 우리의 전통 민요 <아리랑>의 노랫말에 나오는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이란 말이 현재 어원커족의 어휘에 살아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여기에 언어학적 분석은 물론 어원커족의 장례 습속까지 분석해 ‘아리랑’이란 말의 기원이 어원커족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신화와 금기도 눈에 들어온다. 이들은 곰을 숭배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한다. 곰과 살다 아이를 낳은 여자나 곰과 결혼하여 자손을 얻은 남자도 등장한다. 그 자손들이 어원커족과 어룬춘족이라는 것이다.
곰에 대한 금기도 많다. 곰을 할아버지나 할머니라고 부르고, 곰이 죽었을 때에는 잠들었다고 표현한다. 곰 고기를 먹을 때에는 “깍! 깍!”과 같은 까마귀 소리를 내어 까마귀가 먹는 제스처를 하기도 한다. 수렵이 생업인 만큼 금기와 신화에 그 지역의 맹수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러움 이상의 무엇이 있다.
북아시아 전체적으로 발견되는 샤머니즘 역시 동일하다. 부족마다 큰 무당이 있고, 작은 집단인 우리렁에도 무당이 있다. 이들은 삼림 속에서의 이동경로와 같은 우리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람이나 순록에게 병이 생기면 주술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도 한다. 고구려와 부여 역사에서 배웠던 형사취수의 습속이 이들에게도 있다. 솟대문화도 우리와 같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유사성을 굳이 우리 민족과의 연관성으로 무리하게 비약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어구에 옭아맬 필요도 없다. 21세기를 더 크게 보고 역사를 더 넓게 보면서 여러 가지 친연성이 있는 이들 소수민족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어원커족과 어룬촉족 자치기를 찾아가는 의의가 있다.
이 지역은 북방의 삼림과 초원이 교차하면서 자연풍광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곳곳에 자작나무가 하얀 몸뚱이를 줄지어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자작나무 껍질이란 뜻으로 화수피樺樹皮 문화권이라고도 한다. 자작나무 숲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눈이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후룬베이얼 초원에는 강과 호수, 습지가 함께 있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원으로 꼽힌다. 어룬춘 자치기에는 탁발선비의 발상지인 알선동嗄仙洞이 있고, 후룬베이얼 초원은 칭기즈 칸의 동생 카사르의 영지이자 몽골제국 원정군의 휴식처였던 곳이라 유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다시 어원커족과 어룬춘족으로 돌아가 보자.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들의 살아 있는 민족문화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오루구야 어원커족이나 어룬춘족은 21세기가 될 때까지도 순록의 먹이인 이끼와 사냥감을 찾아 삼림 속을 이동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100여 년 동안 러시아와 일본, 청나라와 중국 정부는 삼림을 엄청나게 파헤쳤다. 삼림이 개발될수록 수렵을 할 수 있는 동물들과 순록이 먹어야 할 이끼는 사라져 갔다. 순록이 한 번 이끼를 먹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3년 후에나 다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순록을 위해서는 넓은 삼림이 필요했지만 상황은 반대로만 돌아갔다. 1998년 이 지역에 큰 홍수가 난 다음에야 중국의 삼림 파괴가 약간 수그러들었을 뿐이다.
만주국이든 신중국이든 20세기의 권력은 이들에게 정주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박해왔다. 사회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돈을 벌러 나갔고, 아이를 신식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고, 외지인과 결혼도 했다. 누군가는 대도시로 나가 대학생이 되었고, 순록과 자작나무를 그려 화가로 성공하기도 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하산했고, 산 아래의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산을 떠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어원커족을 보호한다고 정착촌을 세워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생활비까지 대주었다. 그 대신 동물과 자연보호를 명분으로 이동생활과 사냥을 금지시켰다. 결국 2003년 200여 명에 불과한 아오루구야 어원커족은 ‘생태이민’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초라하게 하산했다.
아오루구야 어원커족들은 생기를 잃어갔다. 일부는 정착촌에서 관광객에게 공예품들을 팔았다. 일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로 알코올중독에 빠져들었고, 일부는 산과 정착촌과 도시를 오가면서 방황했다. 순록을 사불상이라 하여 귀하게 여겼으나,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또 다른 사불상이라고 탄식했다. 산에서 순록을 키우는 목축도 아니요, 내려와서는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모르고, 노동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이 하산할 때 마리야 쒀玛利亚索(왼쪽 사진)라는 할머니에게 시선이 모였고, ‘중국의 마지막 추장’이라는 칭호가 따라붙었다. 당시 하산한 어원커족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존경받는 추장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병사한 뒤 추장이 되었는데, 말수는 적고 자상했으며 90년 세월이 주름에 새겨진 할머니였다.
이들이 하산하기 전해에는 마리야 쒀 할머니의 딸이자 어원커족 출신의 성공한 화가 류바柳芭의 뉴스가 뜻있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했다. 어원커족 최초로 대학에 진학했고 화가로 성공도 했지만, 그녀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삼림의 어원커족도, 도시의 생활인도 아닌 한계인으로 방황했다.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리던 그녀가 마흔두 살의 나이에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녀가 죽은 곳은 무릎 깊이밖에 되지 않는 얕은 강물이었고, 그 자리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다.
류바의 뉴스를 듣고 한 여자가 중국의 마지막 추장 할머니를 찾아왔다. 건허에서 북쪽으로 250km 이상 더 가야 하는, 북극의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모허莫河라는 곳에서 태어난 여인네였다.
그녀는 마리야 쒀에게서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밤새도록 듣기 시작했다. 해를 넘기고는 아흔 살의 무당 할머니를 화자로 하는 소설이 출간되었다. 소설은, 아오루구야 어원커족들 모두가 하산하는 날, 산에 남은 ‘내’가 90년 살아온 일생을 조근조근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다.
작가는 자신이 어원커족은 아니었지만 사라지는 어원커를 애써 붙들듯이 그들의 감성으로 썼다. 그 글은 어원커족의 운명과 슬픔으로 읽힌다. 그녀는 이미 루쉰 문학상을 세 번이나 수상했던 츠쯔젠迟子建이었고, 이 소설은 2008년 중국의 마오둔 문학상을 받았다. 《어얼구나 강의 오른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이 되었다.
마지막 추장도 세상을 떠났지만 어원커족의 슬프고 신비로운 산속 이야기는 그들의 박물관에도 남아 있지만 츠쯔젠의 문학작품 속에도 고스란히 남았다.
유난스레 추운 겨울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추운 겨울보다 훨씬 추운 북방삼림의 겨울을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음미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