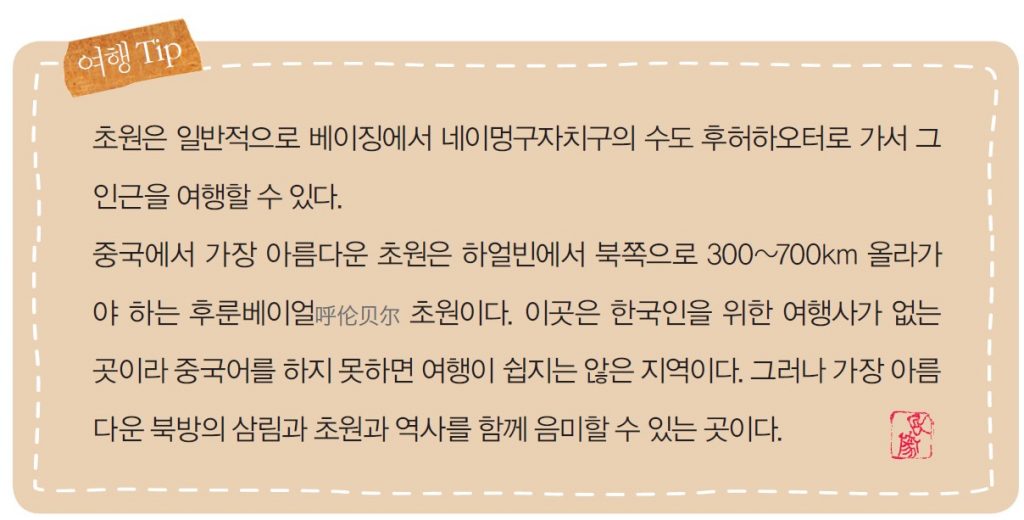네이멍구자치구 게르 – 초원에 바람을 일으켜 세계사를 폭발시킨 사람들
초원, 시선조차 사라져버릴 것 같은 푸른 하늘빛, 티 하나 없는 하얀 구름, 그 하늘 아래 낮게 자란 풀과 키 작은 양들, 목가적인 풍경이 금세 떠오른다. 그런가 하면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 비바람을 몰아치기도 하고, 겨울에는 영하 40도의 강추위가 숨결마저 정지시키기도 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스로 디지털 노마드 또는 21세기 유목민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 손, 어디든 찾아가는 발, 낯선 것을 받아들이면 단기간에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기민함, 이런 것들을 유목문화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동아시아 북방초원에 거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들과 천손天孫이라는 시조신화도 유사하고, 혈통으로도 사촌이고, 문화적으로 비슷한 요소도 많다. 역사심리학적 향수와 비슷한 느낌이다. 말을 타고 질주하는 속도감, 초원에 앉아 느린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 욕구도 대초원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는 초원이 없다. 없어서 더 희구하게 되는 초원의 로망인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대초원을 찾아가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초원은 동아시아에서 몽골공화국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 걸쳐 있다. 초원의 전통적인 동그란 집을 몽골어로는 겔 또는 게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멍구바오蒙古包라고 한다. 멍구는 몽골의 중국어이고, 바오는 만주어의 집이란 말이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의미와 상징으로 새겨지고 있는 초원, 그 초원의 전통적인 살림집 게르를 찾아가 보자.
이 글이 중국 민가기행이기는 하지만 동아시아의 북방초원은 오래도록 몽골 사람들의 강역이었다는 의미에서 게르라는 말을 사용기로 한다.
초원의 아름다운 풍광에 관한 서정적인 기록은 중국 옛 문헌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바로 〈칙륵가勅勒歌〉다.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북조北朝 악부민가의 하나로, 선비족鮮卑族의 언어로 된 민가를 한자로 기록한 것이다. 칙륵은 고대 북방 유목민족의 하나로 철륵鐵勒이라고도 한다. 투르크계이나 4세기에는 선비족에 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칙륵가의 전문이다.
칙륵천 내린 물은 음산 아래로 흘러가네
하늘은 궁려인 양 온 들판을 뒤덮었네
하늘은 푸르고 들판은 가없는데
바람 불어 풀 누울 제 소와 양떼 보이누나
勅勒川 陰山下
天似穹廬 籠蓋四野
天蒼蒼 野茫茫
風吹草低 見牛羊
음산은 네이멍구자치구 중부에 있는 동서로 긴 산맥이다. 황하 중류가 북으로 흐르다 이 산에 막혀 동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남으로 흘러간다. 음산의 북쪽은 몽골고원이고 남쪽으로는 초원과 황토고원이 이어진다.
궁려의 궁穹은 돔형이란 뜻이고, 려廬는 오두막이란 뜻으로 고대 문헌에서 게르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광활한 초원 전체를 덮고 있는 하늘을 거대한 게르로 연상하면서 땅과 하늘의 끝이 만나는 아득함을 노래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원의 풍광은 변함이 없다.


초원의 집 게르는 기능상으로는 이동식 주택이다. 형태로는 원형 평면 위에 원통의 몸체, 원뿔의 지붕이 얹혀 있다. 게르의 외벽과 지붕은 양털로 두껍게 짠 모전毛氈으로 덮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하얗게 반짝인다.
원통 몸체는 ‘하나哈那’라고 하고, 낮은 원뿔형 지붕은 ‘우니烏尼’라고 한다. 하나는 긴 나무막대 여러 개를 대각선으로 교차시켜 만든다. 나무와 나무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구멍을 뚫고 핀을 끼운다. 이때 쇠못을 쓰지 않고, 동물 힘줄이나 연골을 가늘게 잘라서 말린 것을 쓴다. 탄력성이 있어 끊어지지도 않고, 웬만큼 비틀어져도 형태를 잘 유지한다. 정말 지혜로운 부재다. (위 중간 사진).
원통을 이루는 몸통 ‘하나’는 한 개의 부재로 된 것이 아니다. 높이 1.3∼1.6m 정도 되는데 일정한 길이로 서너 개를 좌우로 이어 둥글게 만든다. 작으면 지름 3m 정도이고, 크면 10m가 훨씬 넘는다. 몽골제국의 칸이 거주하는 게르는 이보다 훨씬 커서 수백 명을 수용하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우니는 우산살과 똑같은 구조인데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 우니의 꼭 대기는 하늘을 향해 뚫려 있고, 그 아래 바닥에는 화당을 설치한다. 난로를 설치하면 난로의 연통을 위로 뽑아내기도 한다. 큰 게르에는 중앙에 우니를 받쳐주는 ‘바간’이란 기둥을 두 개 또는 네 개 설치하기도 한다. (위 좌측 사진).
바닥은 나무판으로 덮고 그 위에 카펫과 같은 깔개를 덮는다. 문은 하나의 높이와 같은 탓에 성인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출입해야 한다. 문은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열린다.
게르는 초원이란 자연환경의 산물이고 그것에 적응한 결과다. 원형에다 키가 낮기 때문에 초원의 거센 바람에도 잘 견딘다. 문을 동쪽으로 하나만 낸것도 서풍이 들이치지 않게 한 것이다. 실내공간은 원형이기 때문에 같은 재료로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한다. 육면체의 귀퉁이와 같은 사각死角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지붕의 통풍구는 배기기능이 탁월하다. 한여름 실내온도가 높아졌을 때에는 하나의 아랫부분을 20cm 정도 걷어 올린다. 사방에서 들어온 바람이 지붕의 구멍 하나로 빨려나가면서 순식간에 환기를 시켜준다. 게르 전체를 덮은 모전 역시 초원에서 생산되는 양털로 짠 것이다. 겨울에 방한 성능이 뛰어나다.
게르의 생명은 이동성에 있다. 게르를 펼치는 데 두세 시간이면 충분하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철수할 때는 더 빠르다. 운반도 아주 쉽다. 하나와 우니와 바닥을 해체해서 수레에 실으면 그만이다.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이동하는 게르도 있다. 처음부터 바퀴가 달린 넓은 마차 위에 게르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동할 때에는 소 여러 마리가 마차 자체를 끈다. 부족의 수장이나 제국의 칸은 소 수십 마리가 끄는 게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커다란 고정형 게르는 요즘에는 기념관이나 큰 식당에서나 볼 수 있다.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게르는 초원이란 자연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지역이든 오랜 생활 속에 만들어진 살림집들은 인지제의因地制宜란 말 그대로다.
게르는 북방초원의 전통문화를 담고 있다. 문을 동쪽으로 낸 것은 태양을 숭상하는 것과 일치하고, 지붕 꼭대기의 통풍구는 천손신화의 모티브라고 느껴진다. 게르 안에 누워서 바라보면 하늘로 통한다는 것이 강렬하게 느껴진다.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와 잉태되었다는 유목민들의 천손신화가 쉽게 이해된다.
다시 게르에서 나와 초원으로 걸어보자. 일망무제一望無際, 초원에 가면 보이는 것에 끝이 없다. 땅이 넓으면 얼마나 넓은지, 하늘이 크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게르 앞에 낮은 의자를 놓고 앉아 초원을 바라보노라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걸 느낄 수 있다. 다만 풀 뜯는 양떼와 양떼구름만이 한 뼘씩 한 뼘씩 소리 없이 옮겨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원도 그렇다. 초원을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은 그곳에 우리 손끝에 느껴지는 초원의 역사가 서려 있기 때문이다. 무리 지어 날아왔다가는 산산이 흩어지는 새떼 같기도 하다. 초원을 격하게 들끓게 했던 열풍 같기도 하다. 유목민들의 눈이 빛나고, 그 눈빛이 모이기 시작하면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고, 종국에는 초원과 대륙을 뒤덮었던 것이 초원의 역사였다.
문자로 자세하게 기록된 최초의 동아시아 초원의 제국은 흉노다. 이들은 고대 북방의 여러 민족이 융합된 민족이었다. 척박한 초원에서 살려면 유목민들은 남쪽의 중원과 교역을 해야만 했다. 중원의 제왕들이 교역을 차단하면 약탈이란 강제적인 교역을 감행했다.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하던 시기에 흉노는 진시황이 통일한 땅의 세 배나 되는 광대한 북방초원을 통일했다. 진시황도 사실은 장성을 쌓아 방어하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흉노에게 전면전으로 대항한 중원의 황제는 한고조 유방과 한무제 유철이었다. 과정과 결과는 각각 반대였다. 유방과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후한에게 상당한 재물에 황녀까지 바치면서 전쟁을 회피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평안했고 상당한 국부를 축적했다. 유철은 선대 황제들이 화친을 통해 쌓은 엄청난 국부를 기반으로 흉노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벌였다. 나름대로 적지 않은 승리도 거뒀으나, 국부를 깡그리 탕진하다시피 했다.
한무제 유철은 한나라의 전성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가 벌인 흉노와의 40년 전쟁의 끝자락은 비참했다. 각지에 유민이 넘치면서 인구는 반 토막이 나버렸다. 멀쩡한 세자는 내전에 휩쓸려 자결했고, 그 이후 핏덩이들이 황제에 오르면서 외척과 환관이라는 전형적인 망조가 만연했다.
결국 왕망이라는 자가 나타나 한나라의 숨통을 끊었다. 다시 유씨를 앞세워 한나라라는 이름은 복원했으나 이미 역사의 발전은 기대할 것도 없는 쭉정이였다. 그래서 도처에 황건적이 출몰하는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한나라라는 이름조차 사서에서 삭제된 것이다.
흉노의 일부는 자신의 강역 동아시아 초원을 떠나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여 훈족이란 이름으로 유럽에 나타났다. 일부는 한나라에 융합되고 일부는 새로운 강자 선비족에 흡수되었다.
북방에서 흉노 다음에 등장한 초원의 강자는 선비족鮮卑族이었다. 다싱안링大兴安岭 산맥 북단 알선동에서 살던 탁발선비는 수백 년에 걸쳐 초원 2000km를 이동했고, 5호16국이란 각축전을 돌파하여 북중국을 통일했다.
그들은 흉노의 ‘약탈’보다 원대한 비전을 펼쳤다. 북방과 중원을 정치적으로, 유목과 농경을 문화적으로 ‘융합’했던 것이다. 북위를 거쳐 수와 당으로 이어지는 제국은 모두가 탁발선비의 황실 아래 북방의 호胡와 중원의 한漢을 융합한 역사의 위대한 발전이었다. 역사학에서는 이를 호한융합이라고 한다.
이들의 수백 년 역사를 연구해온 박한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탁발선비의 역사를 ‘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란 드라마틱한 기행서 제목으로 압축했다.

당나라가 수명을 다한 다음에 북방초원은 거란의 요나라와 여진의 금나라가 차례로 패권을 잡았다. 선비족의 한 갈래였던 거란은 전란을 피해 몰려든 한족들을 포용하면서 지금의 네이멍구자치구 츠펑赤峰 등 랴오닝 지역을 중심으로 융성했다. 탁발선비의 호한 융합과는 달리 중원의 송을 압박하면서 중국사 최초의 ‘정복국가’로 올라섰다.
이들은 단순하고 야만적인 정복자가 아니었다. 거란의 찬란한 유물들을 2006년 미국에서 전시하면서 내걸었던 ‘야만인가 문명인가’라는 제목이 잘 말해준다. 중화주의적 시각에서 북방의 야만민족으로 치부했던 거란이 야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문명을 누렸다는 것이다. 고려를 침략했다는 이유로 우리도 오랑캐라 폄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초원의 역사를 너무 안이하게 읽는 것이다.
거란에 치이던 몽골족의 일파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세계사의 영웅 칭기즈 칸(위 사진은 어얼둬쓰Ordus의 칭기즈 칸 릉의 동상)이 태어났다. 칭기즈 칸은 동아시아 북방초원의 역사를 세계사로 폭발시켰다. 몽골고원을 통일한 다음 중앙아시아로, 중원과 남방으로, 중동과 동유럽으로까지 내달았던 것이다.
그들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이었고,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한데 교류시키고 융합해냈다. 1999년 미국 〈타임〉지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인물’로 칭기즈 칸을 선정했던 것이나 <칭기즈 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는 잭 웨더포드의 역사평론 제목이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
몽골제국 이후 명나라가 북으로는 장성을 쌓아 닫아걸고, 남으로는 정화의 항해일지를 태우며 바다를 봉쇄했다. 북방의 정복왕조에 반발한 남방의 쇄국정책인 셈이다. 폐쇄적인 명나라가 수명을 다하자 그다음은 만주족이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했다. 그들은 만주를 통일하면서 초원의 몽골 부족들을 복속시킨 다음 베이징을 장악했다. 결국 100만 인구로 1억 인구의 중국 내지를 통치했다. 중국 내지를 둘러싼 티베트, 칭하이, 신장, 몽골고원 등 동아시아의 초원과 그 주변까지 통합하면서 거대한 다민족 국가 대청大淸제국을 이뤄낸 것이다.
이것이 20세기 초까지의 동아시아 북방초원에 이어진 역사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초원에서 작은 바람을 일으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곤 했다. 그곳이 바로 초원이었다.
20세기 격변을 거쳐 중국 대륙에 마오쩌둥을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이 출현했다. 초원의 반은 만주와 함께 마오쩌둥의 중국에 속했고, 반은 몽골공화국에 속해 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간난고통의 최저점에서 사투를 벌이며 오늘날의 생존력을 만들어왔다. 중원이든 초원이든 또는 대양을 건너온 것이든 남의 것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 초원의 역사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명나라 274년 동안 북방과 초원이 고요한 듯했지만 대청제국이 세계사로 치솟은 것처럼 초원의 미래는 알 수 없다. 대륙과 반도에 각각 일어난 일들이 어떤 변화를 잉태하여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미답의 미래일 뿐이다.
초원의 작은 집 게르에서 나와 초원을 바라보면 넓은 하늘이 커다란 게르로 보인다. 그리고 북방초원의 2000여 년 역사 이야기로 비약했다. 비약은 비약이지만 초원을 자연풍광으로만 느낄 것인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까지 인식하는 기행을 할 것인가는 각자 선택할 몫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나 21세기 유목민이란 말에 공감하는 것은 초원의 거대한 역사가 우리 손끝에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