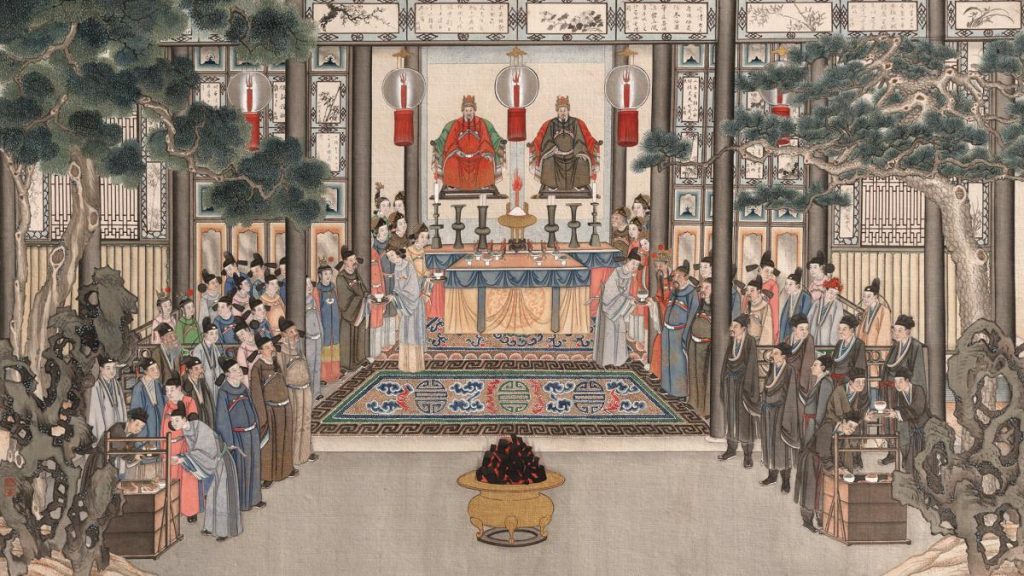제3장 《홍루몽》의 텍스트 지위와 해석 문제
– 관통론, 유기설, 우열론, 구조학, 탐일학(探佚學)
5. 결론: 텍스트의 특징과 구조, 잃어버린 원고의 탐색과 관련하여
근대의 《홍루몽》 판본 연구를 돌아보면 《홍루몽》의 텍스트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사본 시대에 필사자는 《홍루몽》의 문장을 고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판본마다 앞쪽 80회의 문장이 각기 달라졌다. 나중에도 (후스의 신홍학 이래) 어느 부분을 삭제해도 된다는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논자들은 방관이 이름과 차림새를 바꾼 부분과 임사낭[林四娘] 이야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과 해석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텍스트의 불안정성’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정위원의 판각본이 나온 이후 텍스트는 고정되는 듯했지만, 뒤쪽 40회가 ‘위작’인지 여부와 구조적으로 앞쪽 80회와 하나의 총체로 합쳐지는지 여부는 또 새로운 논쟁(후스의 신홍학)을 야기했다. 또 (저우루창의 경우처럼) 뒤쪽 40회를 완전히 떼어내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똑같이 존재했다.
각종 텍스트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내재 구조’와 ‘유기성’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일이다. 이것은 ‘외적 증거’로 작품의 틀을 규정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서와 각종 표본조사는 모두 텍스트의 ‘내재 구조’와 ‘유기성’이 종종 완전히 객관적인 ‘텍스트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재 구조’와 ‘유기성’ 역시 비평가의 ‘발견’과 이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인정하면 ‘내재 구조’에 의거해 도출한 ‘작자의 본의’ 역시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평론가의 견해가 필연적으로 그 안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평론가와 독자이 권위는 이따금 텍스트의 권위를 압도하기도 하며, 평론가와 독자의 의도 역시 ‘작자의 의도’라는 명분을 빌려 세상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앞쪽 80회의 텍스트(지연재 비평을 포함해서)가 암시하는 내용에 의거해서 작동하는 ‘탐일학’을 엄격한 ‘학문 분과’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일이 얼마나 ‘과학화’되고 ‘근거’를 갖추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일이 상상과 추측, 억측과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탐일’을 극단적으로 발휘할 경우 앞쪽 80회에는 이른바 ‘복선[伏筆]’과 ‘은유[影射]’가 두루 퍼져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작할 때에도 “텍스트 곳곳에 은어와 암호가 가득하다”는 색은파의 주장을 떠올리게 만든다.
탐일학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홍루몽》의 문장에 ‘복선’과 ‘뛰어난 문장[奇筆]’이 특별히 많아서 “대단히 오묘하고 기이[妙甚奇甚]”하다고 생각한다. 갖가지 ‘뛰어난 문장’에 대해 세상에서 오직 몇 명 안 되는 전문가들만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탐일학 연구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상자 안의 옥은 좋은 값을 받기 바라고, 화장함 속의 비녀는 날아갈 때를 기다린다[玉在匱中求善價, 釵於奩內待時飛]”라는 구절을 읽고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작업을 하여, 설보차가 나중에 가화에게 시집가게 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저우루창은 이를 해석하며 “세상의 기이한 것들 가운데 기이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보다 더 기이한 것은 없다.”고 했다. 마지막에 그는 이 ‘탐일’ 작업이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군중심리에 영합하면서 스스로 영리한 체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판은 저우루창이 주목하는 “조설근의 뛰어난 문장”은 유효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읽는다면 반드시 뜻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펑치용은 설보차가 가화에게 시집간다는 해석이 설보차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우루창의 비판에 동의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그 와 동시에 이 예는 ‘탐일’ 작업의 주관성을 폭로한다. 즉 당신은 어느 부분이 뛰어난 문장이고 복선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탐일학이 엄격한 ‘학문’이라면 이런 곤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당연히 ‘주관’과 ‘비과학적’ 평론으로는 탐일학 연구자들의 작업을 단번에 말살해 버릴 수 없다. ‘복선’이나 ‘뛰어난 문장’도 《홍루몽》 텍스트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일’의 전문가 본인조차도 탐색의 작업이 무한한 경지까지 이를 수 있음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차이이쟝도 어떤 경우 “잃어버린 원고를 찾은 결과에 온갖 이상한 것이 다 들어 있어서” “보는 이의 이목을 놀라게” 한다고 자랑했다. 량궤이즈도 류신우의 ‘탐일’ 작업에 대해 마찬가지로 ‘일련의 질의’를 제기했지만, 류신우는 오히려 “제80회 이후의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일은 당연히 내가 가장 중시하는 과제”라고 자랑했다. 저우루창은 스스로 “앞쪽의 ‘복선’은 뒤쪽 문장을 보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제81회에서 시작하는 뒤쪽의 문장이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탐일 연구자들은 또 어떻게 앞쪽의 복선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탐일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복선’은 과연 진짜 복선일까? 정말 ‘조설근의 독창적인 뜻[匠意]’이 들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연구자 스스로 인정하는 독장적인 뜻인가? 예를 들어서 “화장함 속의 비녀는 날아갈 때를 기다린다.”라는 구절은 복선인가?) ‘탐일’과 (저우루창의 말처럼) ‘스스로 총명한 체 하는 것’ 사이에는 비교적 개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가? 저우루창 스스로 《홍루몽》을 논할 때 “이 방대한 작품에서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허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 말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만 바꾸면 탐일학의 정곡을 찌르게 된다. 즉, “이 방대한 작품에서 어디가 복선이고 어디가 복선이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문예연구소 판본은 바로 주관과 객관을 융합하려는 시도였지만 주관적인 성분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고, 더욱이 ‘과학’이라 할 수도 없다. 탐일학의 대가 량궤이즈는 잃어버린 원고를 찾고 《홍루몽》을 연구하려면 “예술적 감수성과 깊은 사고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들어맞는 도리이지만,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독자가 구축해 낸 특성(reader’s contribution)’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한 전통적인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심리 해석(psychological interpretation)’에 빠지게 된다.
탐일학 연구자들이 모두 “예술적 감수성과 깊은 사고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설근의 ‘지기’라고 자처하면서 비판하는 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과 깊은 사고력”이 없다고 폄하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학문이자 ‘과학적 연구’로서 탐일학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난제를 처리하지 않고도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일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얻은 “원작 전체의 정신과 면모”는 아마도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 ‘탐일’이 ‘탐일학’으로 상승하기 위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 ‘학문’의 토대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결국은 여전히 탐일 연구자의 ‘깨달음[感悟]’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작업의 결과가 완전한 인정을 받기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다. 즉 탐일 작업을 하는 글에 ‘어쩌면’, ‘아마’, ‘대개’, ‘듯하다’ 등등 단어들의 사용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 작업의 결과를 독자가 완전히 믿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연구자들의 글에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 스스로 그다지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왜 《홍루몽》의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작업이 여전히 일반 독자들에게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것일까?
문학 작품의 흡인력 가운데 하나가 텍스트 구조에 남아 있는 여백(blank) 또는 불확정 지점들(places of indeterminacy)이라는 사실은 필자도 인정한다. 이런 불확정 지점들은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여 채울 수 있게 해 준다. 일단 독자의 상상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텍스트의 흡인력도 자연히 증가한다. 어쩌면 서양의 독자 반응 비평가 이저(Wolfgang Iser)의 말처럼 우리는 그저 텍스트 안에 없는 것들을 상상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일 수도 있다. 텍스트에 적힌 부분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지만, 적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사물을 상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확실히 불확정적인 성분과 여백이 없다면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저는 〈독서의 과정: 현상학적 접근〉에서 이렇게 썼다.
텍스트의 작자는 물론 독자의 상상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많은 서사 기교를 갖고 있다. 그러나 유능한 작자라면 독자의 눈앞에 이야기의 전모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는 아주 빨리 독자를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자가 독자를 끌어들여 텍스트의 의도를 깨닫게 하려면 오직 독자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자(예를 들어서 탐일 연구자)는 현존하는 《홍루몽》이 ‘전모(the whole picture)’가 아니라고 믿음으로써 텍스트를 자신들에게 남겨진 상상의 공간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 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홍루몽》의 제80회 이후는 하나의 거대한 공백 또는 불확정적인 지점이다.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연구자들의 작업 결과도 종종 독자들로 하여금 조설근 《홍루몽》의 구조와 결말이 비범한 데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프랑스의 이론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텍스트를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쓸 수 있는 텍스트(le lisible)’이다. 이런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문학 자체의 ‘활동’과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공동 저작이라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 준다. 《홍루몽》의 텍스트 안에도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탐일학 연구자들이 각 방면에서 제기한 주장들이 대중의 수긍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단정할 수 있다. 독자와 ‘쓸 수 있는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홍루몽》와 ‘잃어버린 원고를 찾는 일’이 매력적이고 생명력을 갖게 하는 원천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홍루몽》의 텍스트와 텍스트 구조가 반드시 해석의 결과를 주재하지 않으며, 반대로 어떤 때에는 해석자가 텍스트의 문장과 의의, 그리고 ‘구조’를 주재한다. 표면적으로 논자는 ‘작자의 원본’과 ‘작자의 의도’를 찾고자 하지만, 사실상 종종 논자 개인의 해석과 가치 판단으로 “원본, 본래 면모, 원래 의도”를 대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