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지시新學之詩’는 19세기 말의 독특한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지어진 특별한 성격의 시를 가리킵니다. 워낙 극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향유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한 파급력도 없었지만 그 자체가 던지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양계초梁啓超가 후에 회술한 내용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양계초의 『음빙실시화飮冰室詩話』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담사동譚嗣同은 자신의 ‘신학지시新學之詩’를 좋아했다. 나는 그의 서른 이후의 학문이 그 이전의 학문을 훨씬 뛰어 넘고 있다고 보지만, 서른 이후의 시가 반드시 그 이전의 시보다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에 이른바 ‘신시新詩’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명사를 끌어다 씀으로써 스스로의 독특함을 드러내기를 즐기는 것이었다. 1896~1897년 사이에 우리 무리의 몇 사람이 이와 같은 투의 시 짓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을 제창한 사람은 하증우夏曾佑였고 담사동 역시 그것을 즐겼다. …… 이와 같은 말은 당시에 함께 공부하던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 당시에 우리 무리는 바야흐로 종교에 심취해 있어 몇몇 교주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보았고 미신을 숭배하는 것이 극에 달해, 서로 시를 짓는데 경전의 말이 아니면 쓰지 않기로 약속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른바 경전이라 함은 불교ㆍ공교孔敎ㆍ예수교의 경전을 말한다. – 『음빙실시화』 제60조.
위의 대목을 비롯해 『음빙실시화』의 다른 조목들에 실려 있는 내용과 역시 양계초가 쓴 「하와이 여행기(夏威夷遊記)」, 「고인이 된 벗 하수경(하증우) 선생(亡友夏穗卿先生)」과 같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학지시’가 지어진 기간은 대체로 1896년에서 1897년 사이이고, 그것을 짓고 감상한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는 양계초가 담사동(1865~1898), 하증우(1865~1924) 등과 북경 등지에서 자주 만나며 새로운 학문과 정치에 대해 토론하던 시기이지요. 양계초가 회고한 연대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들과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일단 청일전쟁이라는 상황을 거친 후의 시공간에서 지어졌다는 점만을 확인해 두기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신학지시’가 ‘신학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때의 신학문이라는 것은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대안적 사유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불학, 양계초 등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종교화시키는 경향까지 있었던 유학, 기독교를 포함해서 서방으로부터 들어온 사유 체계를 두루 일컫습니다. 서구 열강의 거듭된 침탈에 이어 작은 섬나라라고 치부하던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 결과 대만 할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평등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은 중국으로서는 큰 충격이고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계초 등 젊은 개혁지향적인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는 중국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자국의 미래상을 다른 데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지요. 이들은 당시 맹목적으로 전통을 부정하며 한정된 번역서 등을 통해 앞뒤 가릴 것 없이 외래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일종의 사상해방을 지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신학지시’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이차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학지시’의 주요한 측면의 하나로서 개혁지향적인 지식인들이 갈망했던 ‘신학문’ 혹은 사상해방이 시로 체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신학지시의 언어-형식상의 특징에 관해서는 ‘신학문’에서 비롯된 생소한 어구를 시어로 사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증우나 담사동이 쓴 신학지시에서는 ‘黑龍’, ‘據亂’, ‘昇平’, ‘太平’, ‘龍蛙’, ‘敎主’, ‘冰期’, ‘洪水’, ‘巴別塔’(바벨탑), ‘質多’(시타; 범어로 마귀라는 뜻), ‘喀私德’(카스트), ‘巴力門’(parliament) 등 전통적인 어휘나 시어로 보기에는 생소한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지요. 새로운 시어의 도입은 오랜 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던 중국의 시가 새로운 시적 세계를 갖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생소한 시어들은 시의 내용을 난해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시들이 널리 향유될 수 없었던 요소가 되기도 했지요. 양계초는 「고인이 된 벗 하수경 선생」에서 “하증우는 자신의 우주관과 인생관을 시로 써내길 좋아했다. …… 당시에 나와 담사동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새로운 명사를 만들었는데, 항상 같이 지내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었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항상 같이 지내는 몇몇 사람들’끼리 조차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였길래 그랬을까요? 양계초가 예를 든 것 가운데 하증우의 작품 몇 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양계초가 『음빙실시화』에서 하증우가 지은 신학지시 절구絶句 십여 수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라고 소개해 놓은 작품들 가운데 두 수를 보기로 하지요:
빙하기에 세계는 몹시도 춥더니/홍수가 걷잡을 수 없이 낮은 지역을 뒤덮도다/바벨탑 앞에서 종족과 종교가 나뉘고/사람과 하늘은 이로부터 심성參星과 상성商星처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冰期世界太淸凉/洪水茫茫下土方/ 巴別塔前分種敎/人天從此感參商.
-『음빙실시화』 제61조.
“冰期”, “世界”, “洪水”, “巴別塔”, “種”과 같은 적지 않은 ‘신명사’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야 우리에게도 대개 익숙한 한자어들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도리가 없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양계초가 “방하기니 홍수니 하는 것은 지질학자들이 쓰는 말이고, 바벨탑 운운 한 것은 『구약성경』에서 셈ㆍ함ㆍ야벳이 세 땅을 나누어 다스리게 된 일을 기록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서구 근대과학의 성취인 고대 지구에 관한 지식과 『구약성서ㆍ창세기에 나타난 세계관을 버무려 놓은 시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번역을 해 놓고 보아도 실상 이 시가 과연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지요. 또 한 수의 절구를 살펴보면:
여섯 마리 용은 유유히 천제天帝의 곁에 있고/혼란에 맞서는 시대, 상승의 시대를 거쳐 태평의 시대에 이르는 궤적은 실로 오랜 세월일세/상천에는 천자의 큰 아드님 엄정히 계시니/우뚝 선 우리 주 문왕文王이라 불리시네.
六龍冉冉帝之旁, 三統芒芒軌正長. 板板上天有元子, 亭亭我主號文王.
-출처 위와 같음.
양계초는 이 시에 나오는 “여섯 마리 용”과 “문왕”이 모두 공자를 지칭하는 말들이라고 풀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밖에 “원자元子” 역시도 공자를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증우의 많은 ‘신학지시’들이 “은어를 사용하여 교주를 송양했다”라고 한 양계초의 평에 가장 잘 들어맞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자를 ‘교주’로 모시는 이른바 ‘공교孔敎’를 내세우고 이를 추진한 중심 인물은 강유위康有爲(1858~1927)였으며 그를 따라 함께 활동했던 이들도 한때 ‘공교’라는 아이디어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시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바이지만 이와 같은 공자―교주의 구도는 서양의 기독교적 종교관․세계관에 중국의 ‘공자’를 대입해 놓은 성격이 짙습니다. 물론 이미 한대의 유학자로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주석을 붙였던 하유何休에게서 공자를 신격화한 예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자에 대한 ‘문왕’이라는 칭호는 양계초가 밝히고 있듯이, 『춘추공양전』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에 치중하는 공양학가公羊學家들의 이른바 ‘삼통설三統說’ 혹은 ‘삼세설三世說’―즉 역사 발전이 거란據亂(혼란에 맞서는 시대), 승평昇平(태평세로 나아가는 시대)을 거쳐 태평太平에 이른다고 보는 관점―의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공자에게 천제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부여하고 “우리 주”라고 지칭하는 것은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관념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자를 지칭한다고 설명해 놓은 “여섯 마리 용”만해도 그렇습니다. 양계초는 “용”을 공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한 것은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부회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과 뱀은 같은 상징군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생명, 지혜, 초자연적 힘, 강함, 혼돈, 파괴, 어두움 등 다양한 상징적 내함을 갖습니다. 대체로 현재의 서남아시아 지역을 경계로 그 동쪽의 문화권에서는 용은 긍정적인 성질의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그 서쪽의 문화권에서 용은 부정적 성격이 강조되며 특히 유대-기독교 계통의 문화에서 용-뱀은 종종 사탄과 동일시되지요. 「요한묵시록」에서도 용은 명백히 사탄을 의미하며 대천사 미카엘과의 싸움에서 패퇴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의 상징으로서의 용이 어떻게 ‘부회’되었길래 공자를 상징하는 시어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단언하긴 어렵지만 천자, 현자, 생명(물) 등을 상징하는 중국 전래의 ‘용’ 이미지와 기독교 성경 속의 반그리스도의 상징인 용의 이미지가 착종된 채로 서양↔중국/기독교↔공교라는 대립적 구도 속으로 이끌어 들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와 같이 여러 함의가 엇섞인 채 정리되지 않은 이미지나 상징이 시어로 사용됨으로써 난해한 시가 엮어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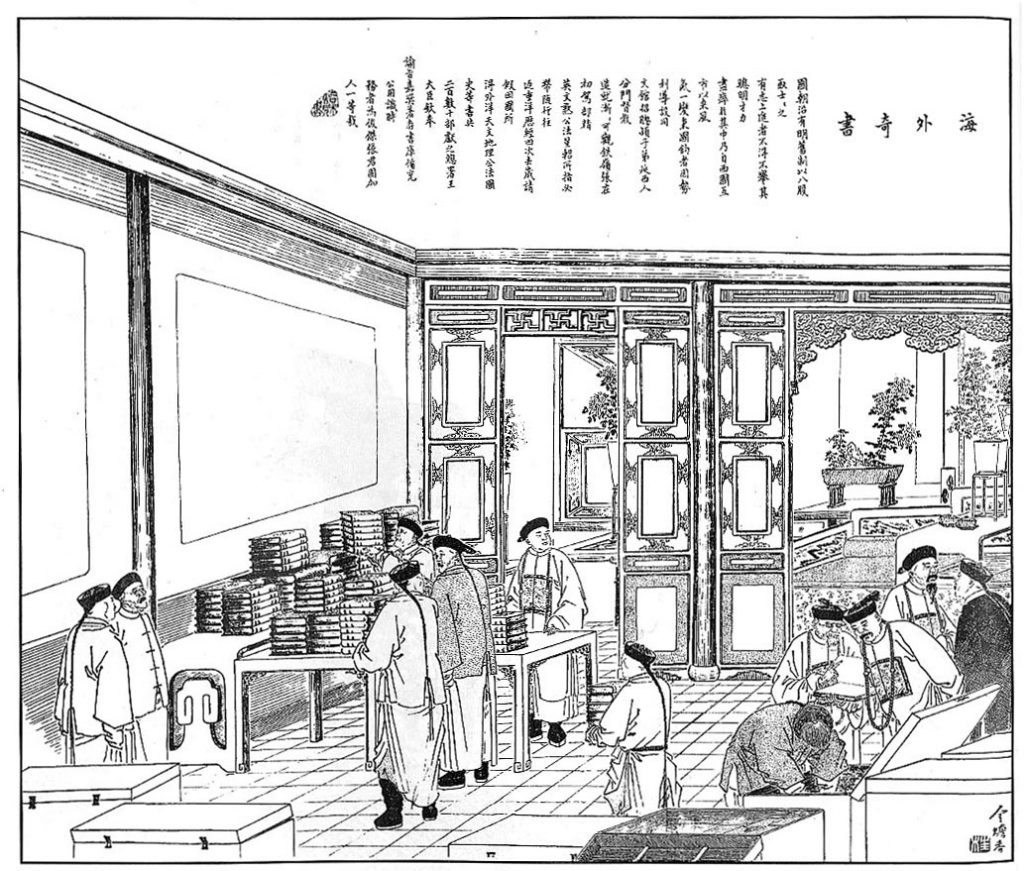
다음으로 하증우의 율시 한 수를 보도록 하지요:
거침없는 초여름 이처럼 가고/면면히 흘러 문왕의 귀감이 여기에 나타나도다/천제가 검은 용을 죽이니 재주 있는 선비 숨어버리고/글씨는 날아올라 붉은 새 되고 태평세는 늦어지도다/인민과 황제가 갖추었나니 세 겹의 믿음이오/사람과 귀신이 함께 도모하나니 백성의 지혜로세/하늘 또한 거스르지 않거늘 하물며 어떤 무엇이 그러랴!/옛 일 바라보매 만물은 일정한 징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滔滔孟夏逝如斯/亹亹文王鑒在玆/帝殺黑龍才士隱/書飛赤鳥太平遲/民皇備矣三重信/人鬼同謀百姓知/天且不違何況物/望先萬物出於幾.
-『음빙실시화』 제60조.
위의 시는 양계초가 「하와이 여행기」에서 ‘신학지시’에 대해 “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 일부를 인용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율시의 기본적인 격률에서 벗어나지 않은 작품이지요. 하지만 생소한 어구의 남용으로 ―앞의 두 절구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격률이 보장하는 독특한 맛은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구의 “문왕”은 앞의 시에서 그랬듯이 공자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구에 관해서는 『묵자墨子ㆍ귀의貴義』 편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묵자가 북방으로 가는 길에 제齊 땅에 들렀을 때 점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데, 그가 묵자에게 “천제가 오늘 북방에서 흑룡을 죽이셨는데 선생의 안색이 검으니 북으로 가서는 아니 되오”라고 충고합니다. 이어 묵자가 이러한 논리에 대해 “만약 그대의 말을 따른다면 이는 천하의 돌아다니는 이들을 금제하는 것이요, 마음을 포위하고 세상을 비게끔 하는 것입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의」 편이 의로운 선비를 올바로 대접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검은 용을 죽이다”로 대표되는 일종의 부당한 금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시에서도 대개 그런 뜻으로 취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에 관한 앞서의 내용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그 함의는 더 복잡해지게 되지요. 넷째 구절에 관해서는 하휴何休의 『춘추공양전해고春秋公羊經傳解誥』의 ‘애공 십사 년 봄, 서쪽으로 수렵을 나가 기린을 포획하다(哀公十四年春西狩獲麟)’ 조목에 대한 주석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상서로움의 상징인 기린이 포획되자 사람들이 노魯 나라 궁문 앞에서 혈서를 써서 이는 주희씨周姬氏의 나라가 망할 조짐이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음날 자하子夏가 나가 보니 “혈서는 날아올라 붉은 새가 되고” 흰 종이만 남았는데, ‘연공도演孔圖’라 서명되어 있고 ‘한漢’이 난세를 바로잡기 이전까지의 역사 전개와 대처 방법이 적혀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네 구절의 경우, 아직 어떤 출처가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시구만 가지고 보면 5, 6구는 어떤 정치적 이상과 관련 있는 듯하고 마지막 두 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종의 원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양계초는 신학지시들에 대해 “구마다 모두 한 가지씩 경전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 “그 출전을 알지 못하면 열흘을 생각해도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출처가 파악된 몇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혹 출전을 안다고 하더라도 작자들이 당시에 이와 같은 시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본 시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하증우가 가졌음직한 특별한 감수성 혹은 이상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 이상으로 어떤 해석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시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선 여기에서 중국 전통시 해체의 매우 ‘돌출적’인 징후를 감지합니다. 사대부 문인의 세계관에 상응하는 미적 형식인 시는 기본적으로 그 보편타당성을 큰 특징으로 하지요. 당시唐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체적인 경향에서 사적인 부분이 보다 강화된 송대의 시 역시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그러한 면을 잃지 않고 있지요. 본질적으로 중국의 ‘시’는 개개인 시인의 것이면서 사대부 집단 전체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지시가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계초가 누차 지적한 대로 이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지어지고 향유되었던 것으로 이미 중국 전통시가의 기본적인 존재방식을 벗어난 공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지시를 낳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당 정도 전통적 사유방식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당시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에서부터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있었고 더 이상(아무리 이들이 ‘공교’를 부르짖었다 해도) 유가의 세례를 받은 전통적 사대부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란 결국 그 내용과 형식간의 균형이 깨지고 그 사이에 비정상적인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학지시’가 ‘시답지 않게’ 되었던 것은 다만 새로운 어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측면으로는 ‘신학시지’를 통해 드러나는 바, 세계를 대하는 주체의 정리되지 않은 의식의 ‘혼돈 상태’와 갖가지 정서가 착종된 일종의 ‘분열감’입니다. 즉 ‘신학지시’에는 ‘중화중심’의 세계관이 충격을 받은 후 중국은 단지 넓은 세상의 일부일 뿐이며 그 세계란 결코 하나의 중심을 갖고 질서 있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주체의 독특한 감수성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학지시’는 단지 전통시 해체의 징후일 뿐 아니라 붕괴하는 중화제국의 우울한 초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20세기 벽두에 양계초는 ‘시계혁명’을 제기하면서 ‘구풍격舊風格’에 입각한 ‘시의 시다움’의 확보를 강조하였고 ‘신학지시’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시의 감응력을 통한 선전과 계몽의 필요성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신학지시’를 낳은 주체들이 안고 있던 정체성의 흔들림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었거나 완화되었으며 이들이 개혁을 통한 중화 재건을 꿈꾸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정기